2025. 1. 31. 09:15ㆍ아티클 | Article/칼럼 | Column
Architectural Comment on the Matrix of the Society of Oblivion
※ 서평 도서 : 『이제 제대로 지읍시다』, 함인선 지음, 글씨미디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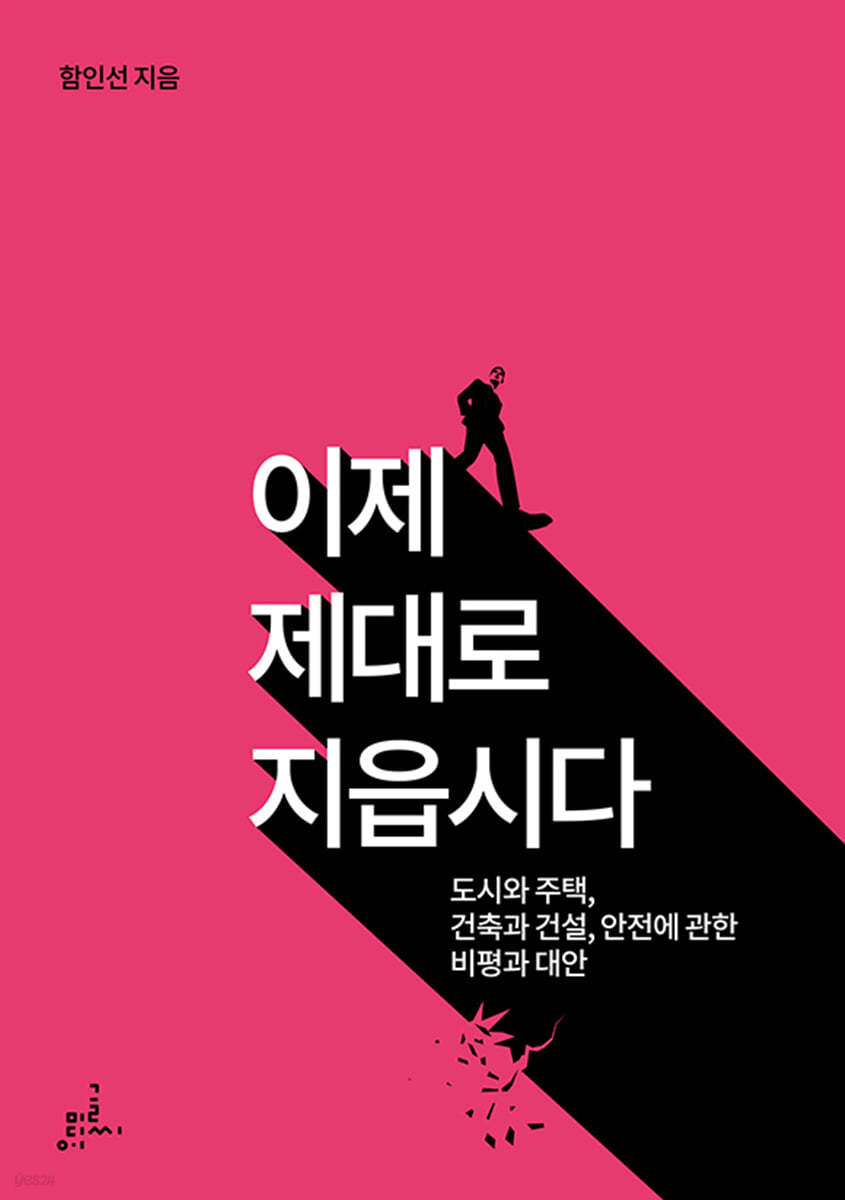
이 책의 저자인 건축사 함인선은 ‘구조’ 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냥 ‘구조’가 아니다. 건축 구조의 전문가이지만, 사회 구조를 읽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 건축 구조가 역학의 영역이라면, 사회 구조는 인간 구성원들 간의 역학 관계다. 저자의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25년 전 『건축은 반역이다』(1999)에서부터 이미 나타났다. 당시 그는 건축을 “자연에 대한 반역”으로 정의하며 “‘건축’을 ‘건축 밖’에서부터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했고, 건축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메타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건축이 건축 외부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했다. 이러한 메타적 관점은 이후 그의 모든 저서에 스며들었다. 『구조의 구조』(2000)와 『텍토닉 스튜디오』(2003)부터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2014)과 『건축가 함인선, 사이를 찾아서』(2014)에 이르기까지, 그의 글은 늘 건축 구조와 사회 구조 ‘사이’에서 양자가 얽힌 ‘매트릭스’를 종횡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이번에 나온 신간 『이제 제대로 지읍시다』(2024)는 그간 그가 벼려 온 메타적 시선들이 거의 총체적 범위로 종횡무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분야의 모순일지라도 전 영역을 횡단하면서 연쇄 반응을”(8쪽) 일으키는 데다, 그렇게 모순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가 “거듭되는 실패와 사고에도 좀처럼 (…) 바뀌지 않고”(6쪽) 있다고 진단하는 그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망각에 맞서”(5쪽) 지난 7년간 주요 일간지들에 기고한 칼럼들을 ‘도시’, ‘주택’, ‘건축’, ‘건조물의 안전’, ‘건설업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횡적 범주로 분류한 다음 ‘그때’와 ‘지금’을 종적으로 비교하며 현시점의 생각을 덧붙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사회의 망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와 달리 지금은 변한 저자의 생각이 엿보이기도 한다. 10년 전 『사이를 찾아서』가 ‘건축과 구조 사이’, ‘건축과 도시 사이’라는 횡적 분류 속에서 건축사로서 지난 작업들을 회고했었다면, 이 책은 더 세분화된 횡적 범주 속에서 우리 사회의 그때와 지금 ‘사이’를 종단하며 지난 시평과 지금의 생각을 메타적으로 엮어 낸다.
저자는 이 책이 “너무 박람”해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메타적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의 줄기는 일관되게 이어진다. 그에 따르면 “시민 권력이 품격 도시를 만든다”(1장). “품격이 있는 도시는 공동선과 사적 이해가 화해하는 지점을 찾아내어 질서 속에 개성이 살아 있게 만든다”(65쪽). 폐쇄적인 단지형 아파트 대신 “중층 중밀도”의 가로주택으로 경계의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고(2장), “공적 영역인 도시와 사적 영역인 건축의 접면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122쪽)이 요구된다. 이는 모두 특정 사익에 집착하기보다 일반 시민에게 힘을 고루 분배하는, 말하자면 닫힌 단지가 아닌 열린 경계를 구현할 때 비로소 ‘품격’이 생긴다는 얘기다. “한국에 프리츠커 수상자가 없는” 또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이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3장). 건축이 아닌 건설 위주의 사고방식이 공동선보다 사적 이해나 지배 권력의 표상에 집착하며 공공성을 왜곡해 왔기 때문이다. “공공건축의 주인은 공공(公共)이다. 그런데 공공을 공무원들은 종종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 공공(公共)의 선을 위해 나서야 함에도 관료주의는 공정성에 대한 알리바이로 공공(公空)의 익명성 뒤로 숨는다”(172∼3쪽). 건설 산업이 건축 문화를 지배해 온 현실은 관료주의적 공정성이라는 공(公)적 명분이 지배 권력의 표상과 결탁하여 공(共)이라는 시민 권력을 억눌러 온 역사의 산물이다. 저자는 “건물은 일하고 건축은 말한다”(165쪽)고 명쾌하게 구분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건축은 일하는 건설에 억눌려 왔다. “우리나라 건축 클라이언트의 수준”은 건설과 건축도 구분하지 못하며, 건축의 담론 생태계도 산업 인프라도 공공건축 획득 프로세스도 후진적인 상황이다(169∼72쪽).
‘건축’에 관한 3장이 끝나고, 이 책의 주제는 건설과 안전으로 넘어간다. 1∼3장이 주로 건축의 공공성을 왜곡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후진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왜곡된 공공성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가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4∼5장은 ‘건조물’의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건설업’의 구조적 모순을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시민 안전과 정의에 필요한 비용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사회는 전근대적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의가 늦을수록 중세형 사고는 거듭될 것이다”(183쪽). 이러한 “저비용, 고위험으로 고착된 건설 산업 생태계”(204쪽) 속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 사회는 곧잘 ‘안전 불감증’이라는 진부한 해석으로 개개인의 의식을 탓하지만, “문제는 의식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209쪽). “미국 소방대원 115만 명 중 의용 소방대원이 80여만 명이며 95%가 소규모 지역에 속해 있다. 이들은 (…) 평소에는 감시와 예방을 하며 사고 시 전문 소방대와 협업한다. 날로 복잡/복합화되는 현대 건축을 칸막이 행정으로 다룰 시대는 지났다. 시민들을 학습시켜 장소 중심형 파수꾼으로 파송하라.”(210쪽)
제인 제이콥스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에서 시민의 ‘눈’이 도시의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갈파했듯, 저자도 “눈 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요청한다(216쪽). 결국 안전한 도시도, 품격 있는 도시도, 프리츠커상을 받을 만한 품격 있는 건축과 건축사도 모두 ‘시민 권력’의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태생적으로 국가 지배형”이었던 “건설 카르텔”은 시민의 “안전을 수탈하도록 설계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고(270∼1쪽), 그 와중에 시민의 삶은 “무법과 불법이 권세인 동네 건축” 또는 이른바 “집 장사”가 짓는 “저렴 주택”의 위험에 노출되었다(274∼5쪽). 그 결과는 25년간 GDP 비율이 반으로 줄었는데, 산재는 1.5배로 늘어난 “킬링필드 건설 현장”(267쪽)이자, 숱하게 뉴스를 장식해 온 우리가 익히 아는 참사들이다.
저자는 각론적으로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만, 이 짧은 글에서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 다만 흔히들 우리 도시에서 현상적으로 느끼는 ‘품격’의 문제를 사회 구조에서 소외된 시민의 ‘안전’ 문제로까지 연결하는 손재주꾼(bricoleur)식 꿰어 읽기가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겠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합리적인 눈으로 읽으며 풀어내는 이 인식의 매트릭스는 과거의 억눌린 무의식을 소환하며 미래의 해법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공(公)에 억눌린 공(共)의 시민 권력을 되찾는 건축과 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제대로 짓자”는 메시지의 저간에 흐르는 근본 코드가 아닐까?
글. 조순익 Cho, Soonik 번역가·서평가
'아티클 | Article > 칼럼 | Colum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비평]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존재와 시간의 건축 2025.1 (0) | 2025.01.31 |
|---|---|
| 건축의 또 다른 이름, 사색 2025.1 (0) | 2025.01.31 |
| 나는 길을 잘 가고 있나? 2024.12 (0) | 2024.12.31 |
| 제24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여기 2024.12 (0) | 2024.12.31 |
| 사피엔스,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2024.12 (0) | 2024.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