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9. 09:04ㆍ아티클 | Article/디자인스토리 | Design Story
Typography, The better it is, the less it becomes visible
드디어 돋보기 안경을 샀다. 근시 안경을 벗으면 그런대로 보였지만, 이제는 정말 눈이 침침해져서 작은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 포장지의 설명서는 독서가 불가능하다. 글자가 작은 것은 물론 짙은 색 바탕에 흰색도 아닌 핑크색 따위의 색을 입힌 활자는 눈이 좋아도 읽기 어려울 판이다.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한 뒤라야 비로소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노안이 온 건 꽤 되었지만, 안경을 벗으면 그런대로 보였다. 하지만 안경을 벗는 일도 귀찮고 이제는 멀리서 봐도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생애 처음으로 돋보기 안경을 구입했다.

10여 년 전 월간 <디자인> 편집장 노릇을 하던 시절 우리 발행인이 리뷰를 할 때마다 잡지의 본문 글자가 너무 작아 읽을 때 눈에서 진물이 난다며 글자 크기 키우자고 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7포인트 크기 캡션도 잘 읽을 수 있었으니 발행인의 말에 공감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우리 잡지 평균 독자는 발행인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니 더욱 그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었다. 내가 요즘 이 잡지를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에서 진물이 난다. 참 인생이란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이 일은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라는 이 단어의 어려움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대중은 때로는 ‘디자인’이라는 말조차 전문적이라고 느낀다. 하물며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이 가장 많이 만나는 디자인, 매일 경험하는 디자인,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디자인이 바로 타이포그래피다.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다루는 일인데, 어떤 사람도 살아가면서 활자의 쇄도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걸어 다니면서 마주치는 간판들, 지하철과 정류장의 사인들, 스마트폰 속의 문자들, 각종 찌라시들…….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활자와 마주치는 일은 숙명적이고 필연적이다. 문명의 역사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말하고 듣는 언어에서 쓰고 읽는 활자로 옮겨온 과정이다. 이제는 옆 사람과의 대화조차 문자로 하는 시대가 아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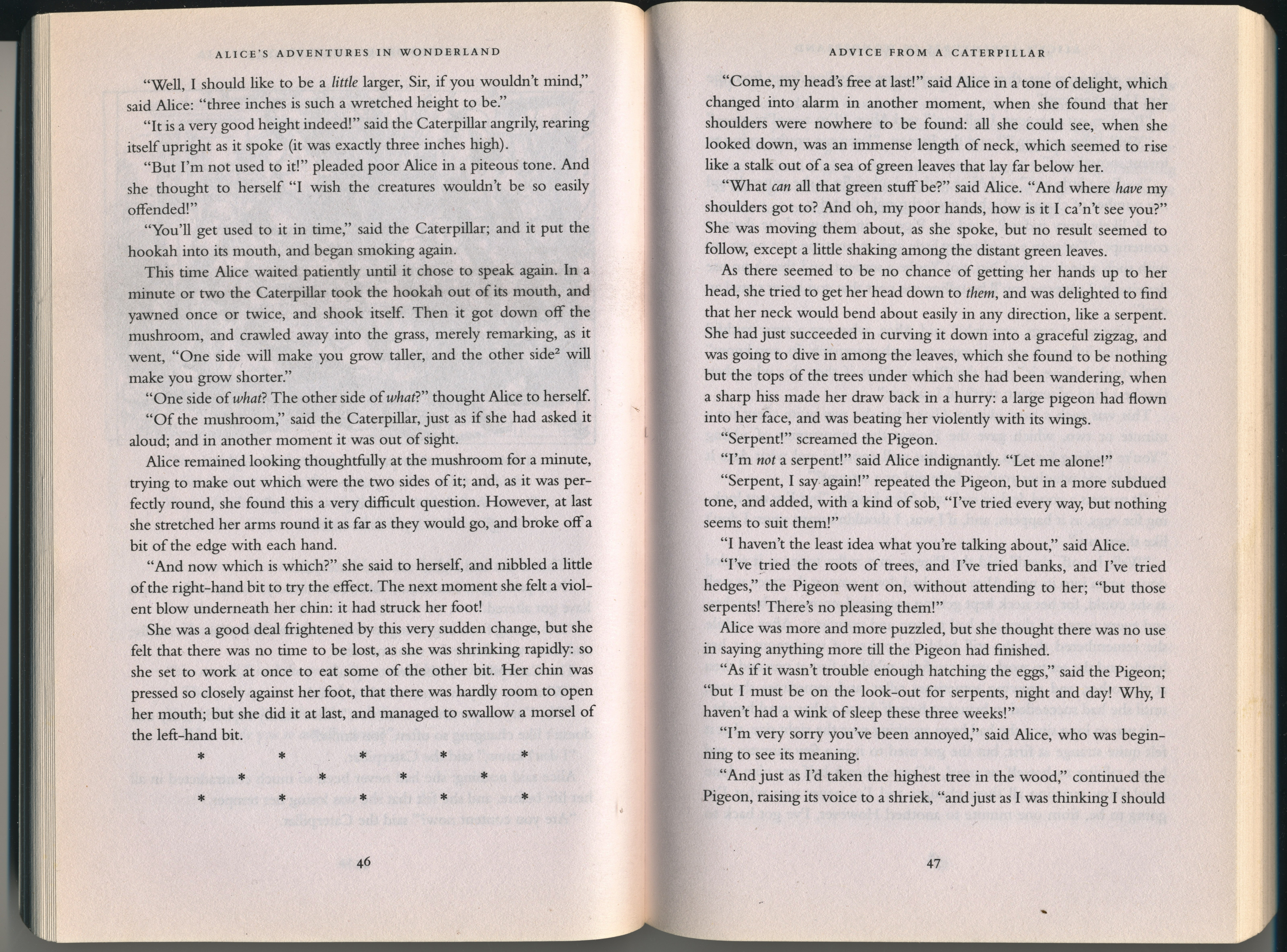
그리하여 타이포그래피는 공기가 되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디자인 정책을 펴면서 “디자인은 공기 같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의 디자인 정책은 디자인으로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다. 정형화되지 않은 이 독특한 디자인은 오시장이 그토록 원했던 랜드마크의 기능을 하도록 선택된 것이다. 이것이 공기 같은 디자인인가?

공기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보자. 공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공기가 없다면 곧바로 죽음이다. 하지만 공기만큼 느낄 수 없는 것도 없다. 우리는 공기를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단 공기가 나빠지면 비로소 공기를 느낀다. 도시를 떠나 깊은 산속에 갔을 때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느낀다. 그때조차 공기는 자극적인 음식과 달리 은근하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이런 공기의 성질을 디자인에 비유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랜드마크 건물, 런웨이의 화려한 의상, 카림 라시드 류의 스타 디자이너가 만든 조각 같은 가구는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익명의 디자이너들이 별다른 대가 없이 하는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이다.
<헬베티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헬베티카는 스위스에서 탄생해 20세기에 가장 많이 쓰인 산세리프 서체다. 이 서체의 특징은 완성도는 역대 어느 유명 서체 못지않게 높지만, 대단히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중립을 추구하는 스위스라는 국가의 성격에 딱 맞는 그런 서체다. 그리하여 국제주의 타이포그래피를 대변하는 서체가 되었다. 국제주의 타이포그래피 역시 개성이 강하고 자극적인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디자인이다.

이 영화에서 헬베티카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많이 활용한 그래픽 디자이너 마시모 비넬리가 등장해 자신의 타이포그래피 철학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서체가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체가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자는 그 기호가 가진 뜻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활자의 독특한 모양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마시모 비넬리는 철저하게 메시지 전달에 충실하려는 디자이너다. 활자가 특이하면 그것에 이목이 집중되고 오히려 활자의 본질적 기능인 의사 전달은 소홀해진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타이포그래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그는 메시지 전달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높은 가독성을 위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그것은 글자의 간격, 단어의 간격, 단의 길이, 행간의 간격, 단과 단 사이의 간격, 이미지와 단의 간격, 종이의 색과 활자 잉크의 대비, 올바른 글자의 선택 등등……. 사소해 보이는 것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일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완벽하게 읽기 쉽고 조화로운 지면을 만드는 일이다. 그 일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독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마치 공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공기를 느끼지 못하듯이 타이포그래퍼는 독자가 그의 위대한 작업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했을 때 최고의 디자인에 이른다. 세계적인 타이포그래퍼인 에릭 슈피커만은 <타이포그래피 에세이>에서 이 일이 얼마나 보상 없는 일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보를 제공하되 독자의 주의가 해당 기사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누군가 모든 글줄과 단락과 단을 꼼꼼히 다듬어 체계적인 지면으로 구성했다는 사실을 독자가 신경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디자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까다로운 작업에 쓰이는 글자체는 ‘당연히’ 눈에 띄지 않는다. 너무나 평범해서 독자가 그것을 읽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 활자 디자이너가 잘 알려지지 않는 직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누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겠는가? 그럼에도 우리 생활의 모든 움직임은 활자와 타이포그래피에 의해 정의되고 표현되며 그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은 노안이 된 내 눈 탓이지, 타이포그래퍼의 탓이 아니다. 하지만 특이한 바탕 색과 특이한 색채를 활자에 입혀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타이포그래퍼의 탓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에 굴복했다. 오로지 읽히되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숙명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만약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이 공기 같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는 자하 하디드보다 조금 덜 비용이 들고 조금 더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택했을 것이다. 아울러 랜드마크는 드물어도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글. 김신 Kim, Shin 디자인 칼럼니스트

김신 디자인 칼럼니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2011년까 지 월간 <디자인>에서 기자와 편집장을 지냈다. 대림미술관 부관장을 지냈으며, 2014년부터 디자인 칼럼니스트로 여러 미디어에 디자인 글을 기고하고 디자인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고마워 디자인>,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쇼핑 소년의 탄생>이 있다.
'아티클 | Article > 디자인스토리 | Design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플과 PC 2020.10 (0) | 2023.01.25 |
|---|---|
| 포르노의 기호학 2023.1 (0) | 2023.01.19 |
| 블랙의 기호학 2020.8 (0) | 2023.01.18 |
| 야구 유니폼의 다양성 2020.7 (0) | 2023.01.17 |
| 영화 소품이 발휘하는 환유의 힘 2020.6 (0) | 2023.01.16 |
